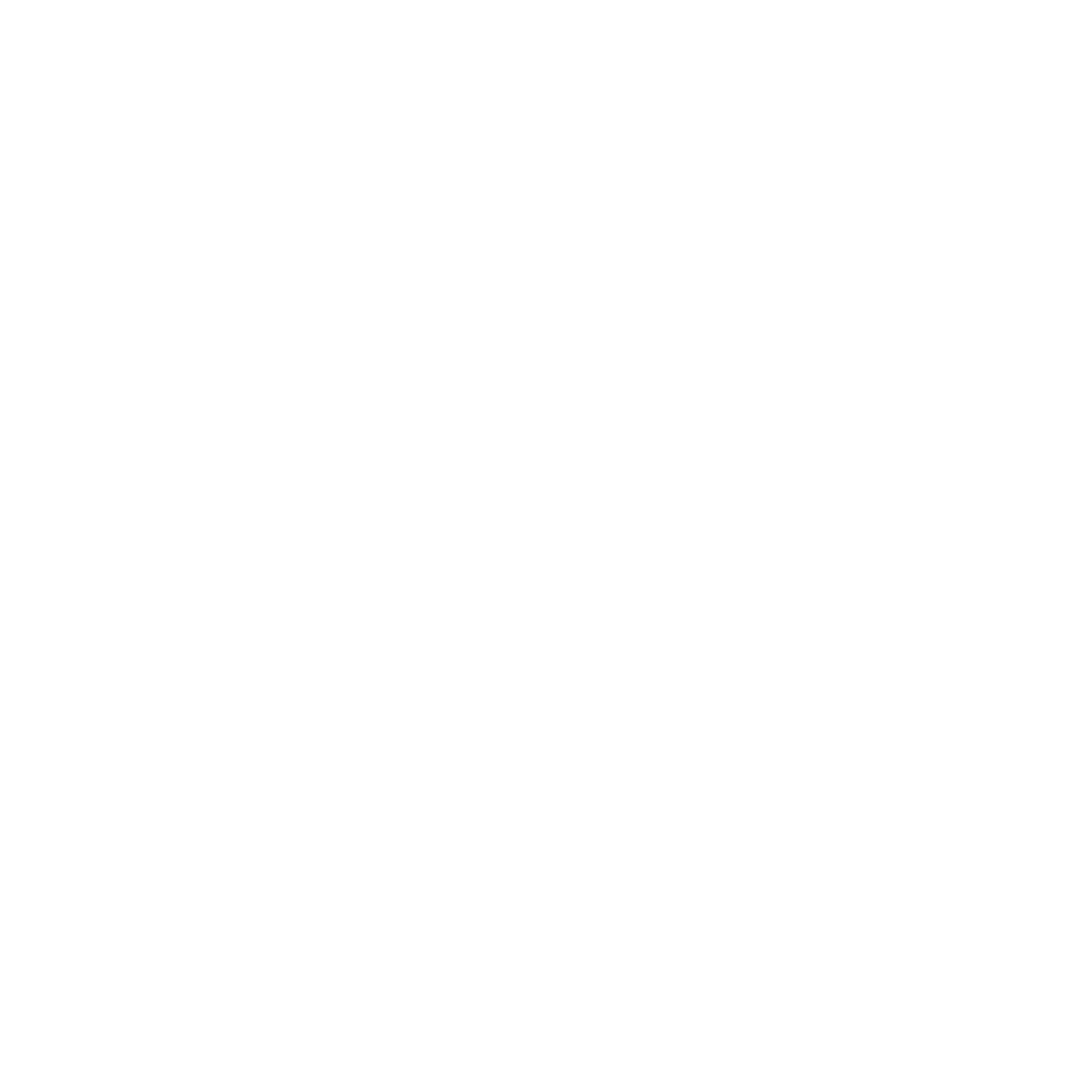국내 최초 협동조합형 아파트 ‘위스테이’의 조합원들이 서울 중구 명동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앞으로 함께 살아갈 주거 공간과 커뮤니티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회혁신기업 더함
초역세권, 프리미엄, 자산가치
신축 분양 아파트의 홍보 문구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열쇳말들이다. 심지어 최근 어떤 아파트 홍보물에서는 자신들의 브랜드를 선택하면 ‘내신이 올라간다’는 문구를 발견하기도 했다. 공간을 둘러싼 자본주의적 욕망을 이처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장(場)이 또 있을까?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도시학자인 앙리 르페브르는 현대 자본주의의 생산관계가 재생산되는 공간, 소외의 모든 형태를 담고 있는 공간으로서 ‘도시’ 문제에 주의를 기울였다. 르페브르에 따르면, 현대의 도시 공간 안에서 교환가치는 사용가치를 압도하고 있으며, 도시는 단순한 거주처로서만 기능할 뿐 사람들의 권리 공간으로서 사유되지 않고 있다. 그의 철학을 비판적으로 계승한 데이비드 하비는 <반란의 도시>라는 저작에서 어떤 도시를 원하는지의 문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고자 하는지, 사회 및 자연과 어떤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지, 어떤 생활양식을 원하는지의 문제와 밀접하게 연계돼 있다고 역설했다. 이런 점에서,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논하는 것은 곧 우리 삶의 지속가능성을 논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도시의 주인은 시민?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이야기할 때 ‘도시의 주인은 시민’이라는 명제가 의심 없이 통용되곤 한다. 시민들이 도시에 대한 주인의식을 가지고 권리를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일 텐데, 시민들에게 정말 그러한 권리가 보장되고 있을지는 엄밀하게 고찰해 볼 일이다.
앞서 언급한 하비는 “공유재를 사용할 권리는 공유재를 생산한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시 말해 도시를 만들어낸 집단적 노동자들이 도시권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도시의 주인은 그 안에서 일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며, 이들의 요구에 맞게 도시가 만들어지고 변화해 가야 한다. 하지만 소수의 개인과 법인, 국가가 대부분의 토지 및 공간을 소유하고 있는 지금의 도시 구조 내에서 그런 권리들을 실현해 가기란 쉽지 않다.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도시의 소유와 전유의 구조를 사용자와 수요자 중심으로 바꾸어 내는 일이 그 어떤 것보다 선행돼야 한다.
지금, 여기의 ‘희년(jubilee)’
소유의 재분배와 토지 정의를 이야기할 때, 많은 이들이 성서의 ‘희년제도(jubilee, 주빌리)’를 언급한다. ‘희년’은 50년마다 돌아오는 안식의 해로, 이때가 되면 노예를 석방하고 매매됐던 토지를 원래 주인에게 다시 돌려주었다. 이는 단어가 뜻하는 바 그대로, 현재의 가난과 고통이 대를 이어 내려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희망을 준다. 그런데 만약 가난과 고통의 대물림이 끊어낼 수 없는 굴레라면? 차라리 세대를 잇지 않겠다는 선택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0%대로 떨어졌다는 한국의 출생률 수치는 시민들이 체감하는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과 맞닿아 있다고도 할 수 있다.
자산 대물림 수단으로 부동산 증여가 많이 선택되고 있을 만큼, 부동산은 한국 사회의 빈부 격차를 심화시키는 원인으로 꼽힌다. 또한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젠트리피케이션은 오랜 기간 지역을 가꾸어 오던 주민들을 내쫓는 방식으로 도시를 재편 중이다. 도시는 가진 것 없는 이들이 계속해서 변두리로 쫓겨날 수밖에 없는, 치열한 전장(戰場)이 되어 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시민 자산화 혹은 공동체 자산화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새로운 방식의 공간 소유 실험들은 우리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아직은 활동단체들의 사무 공간과 지역의 일부 공유 공간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주거 공간과 토지 전반에 점차 적용해 간다면 좀 더 근본적이고 거대한 전환을 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더 가져야만 좋은 공간 누리는 도시
도시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 공간의 주인이 된다는 뜻만은 아니다. 공간의 다양한 규칙들을 함께 논의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는 것이기도 하다. 그리고 공간의 운영 철학은 당연히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손꼽히는 포틀랜드의 사례를 살펴보자. 포틀랜드의 95개 주민자치 조직은 도시의 계획, 시설 및 서비스 공급 등에 관해 결정하는 거버넌스에 참여하면서, 살고 싶은 도시를 직접 만들어 가고 있다. ‘친환경 도시’를 표방하는 포틀랜드에는 대중교통, 자전거 도로가 잘 조성돼 있으며, 현지 농산물을 주재료로 삼는 레스토랑과 파머스마켓이 수시로 열려 소규모 농가들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한다. 포틀랜드의 수많은 방문자는 그곳에서 ‘좋은 삶’의 모습을 발견했다고 증언한다.
우리 중 상당수가 도시에서 나고 자라, 이곳에서 일자리를 얻고 살아간다. 그리고 좋은 삶보다는 ‘성공한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 각자 전력을 다해 질주하고 있다. 그 속에서 도시는 삶의 활기와 표정을 잃었다. 도시가 명품에 비유되고 기업하기 좋은 공간으로 조성되는 동안, 정작 그 안에서 살아가는 다양한 주체들은 소외되고 쫓겨나야 했다.
도시 공간을 자본 논리에 따라 계층화하고 파편화하는 이들은 우리에게 자꾸만 묻는다. “어디에 사느냐”라고 말이다. 가진 정도에 따라 사는 곳과 환경을 결정해야 하는 현실 속에서, 어디에 사는지를 묻는 것은 또 다른 폭력으로 다가갈 수 있다. 더 가져야만 좋은 공간과 삶을 누릴 수 있는 도시는 이미 지속가능한 도시가 아니다. 이제 누구와 어떻게 공존해 살아갈 것인지로 질문을 전환해야 할 때이다.
‘어디에 사는지보다 누구와 사는지’.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한 자산화와 다양한 삶의 실험들을 모색하는 협동조합형 아파트 ‘위스테이(WE STAY)’의 캐치프레이즈다. 이제 막 한 걸음 나아갔을 뿐이다. 다양한 주체들과 함께, 더 다양한 캐치프레이즈로 변주해 가고 싶다.
양동수 (사회혁신기업 더함 대표)
해당 글은 2019년 10월 22일자 <한겨레신문>을 통해 발행된 칼럼입니다.
▷ 이제는 ‘누구와 어떻게 공존해 살아갈지’를 고민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