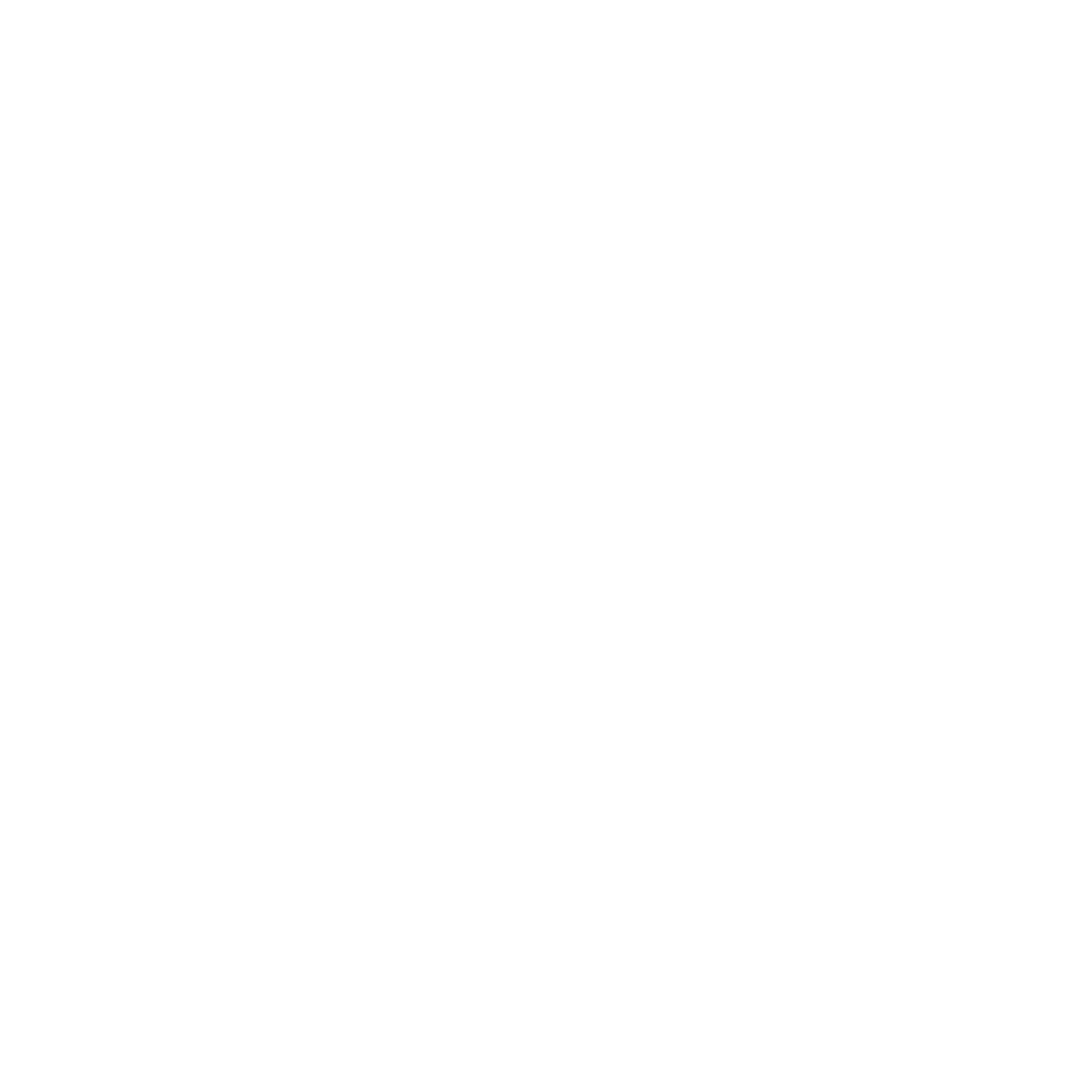Editor 박종일
집은 공기 같은 존재였다. 가세가 기울며 방은 좁아졌을지언정 집이 소멸한 것은 아니었고, 주거에 대한 고민은 온전히 부모님의 몫이었으니까. 애인과 헤어져 이불을 뒤집어쓰고 펑펑 울었을 때도, 취업에 낙방해 마음에 생채기가 났을 때도 방은 건재했다. 그것은 마치 선사시대부터 그곳에 존재했던 것처럼 자연스러웠다.
자아실현의 꿈을 안고 연고 없는 서울에 상경한 친구는 그때만큼 불안했던 적도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출근하기 전날 서울에 도착해 회사 옆 작은 고시원에 몸을 뉘었는데, 숨이 턱턱 막히는 느낌에 제대로 잘 수 없었다고 했다. 우스갯소리로 ‘내가 죽어도 아무도 모를 거다’는 말을 했지만 그것은 농담이라기보다 일종의 체념에 가까웠다. 그는 쾌적한 공간을 얻으려면 교통을, 시설을 포기해야 했고, 볕이 잘 드는 창문을 얻기 위해서는 월급의 30%를 따박따박 월세로 내야 한다고 했다. 나는 처음으로 집이, 의지할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것인지를 실감했다. 그것은 우리를 불안하게 했고, 그 불안은 덩치가 컸다.
위스테이 입주자들을 인터뷰하면서 나는 그 불안의 몸집이 줄어드는 모습을 봤다. 그들이 전에 살던 집들은 아이를 키우기에 위험했고, 이웃들은 그들이 의심스럽고 피곤한 사람은 아닌지 살폈다. 표류하듯 집을 옮겨 다니기도 했다. 그러나 위스테이에서 많은 것들이 바뀌었다. 거리두기 때문에 학교를 쉬어야 했던 아영이는 동네 친구가 생겼다. 촬영하는 날에 자전거를 타고 와 우리에게 먼저 손을 흔들기도 했다. 어린이 자치회를 하는 고야는 한 번 봤다고 경계심이 풀렸는지 히죽 웃으며 말을 걸어왔다. 공동육아, 육아 품앗이로 그 부담이 줄어 자기를 찾는 사람도 생겼다. 이은정 님, 한보람 님은 동아리와 모임을 이끌며 ‘누구 엄마’가 아닌, 나로 살고 있었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부동산을 매매해 미덥지 못한 집에서 벗어나려는 이 탈출의 시대에, 시니어 입주자 민현기 님은 더 이상 부동산에 매여 살지 않겠노라 단언했다. 그는 시니어 모임을 이끌며 아침에 걷고, 저녁에는 글을 쓰면서 인생 후반전을 준비한다. 이경래 님, 이범수 님은 별내에서 머무르는 시간을 늘리겠다고 말하며 공동체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고민하고 있었다.
우리는 집을 갖기 위해 노력하지만, 그것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옆집에 사는 이웃은 여전히 의뭉스러운 타인으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집’의 경계는 조금 더 넓어져야 한다. 아직 해야 할 것이 많지만, 위스테이 구성원들은 각자 다른 배경과 사연을 가지고 있음에도 서로의 어깨에 기대어 연대하고 있었다. 이들은 단순히 무리를 이룬 게(Banding Together) 아니라, 더 나은 세상을 향한 믿음으로 함께 엮이고(Bonding Together) 있었다.
■ [옆집 사람] 서울에서의 4일, 별내에서의 3일
■ [옆집 사람] ‘누구 엄마’가 아닌 ‘나’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보금자리
■ [옆집 사람] 마음을 만나는 매주 목요일
■ [옆집 사람] 꾸물꾸물, 고야의 세계는 넓어지고 있다
■ [옆집 사람] 오후 네 시, 곰돌이 놀이터
■ [옆집 사람] 우리는 갈수록 단단해진다
■ [옆집 사람] 발견의 기쁨